[열 개의 우물] 함께였기 때문에 꿀 수 있었던 꿈다큐멘터리 <열 개의 우물>이 2024년 10월 30일 개봉했다. 70-80년대 여성노동과 인천 빈민지역의 탁아운동을 함께 했던 여성들을 찾아가고 있다. 그녀들은 어떻게 서로에게 기대어 그 시대를 살았는지, 그 이후의 삶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담고 있다. 가난한 여성들과 아이들을 따뜻하게 함께 품어냈던 그녀들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서 열 편의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편집자말>
글을 쓰겠다고 창작실에 들어온 참이다. 바다가 지척에 있어 풍경이 좋은 곳이다. 창작실 입주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마침 옆에 있던 지인이 물었다.
"집에 돌봐야 하고 그런 건 없어요?"
꽤 길게 집을 떠나 있어야 하니 묻는 소리였다.
"돌볼 생명체라고는 저밖에 없어요."
1인 가구인 데다가 풀포기조차 키우지 않는다. 키울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녔다. 돌봄이 무거운 일인 건 주워들은 것이 있어 알지만 그걸 실행할 마음 무거움은 없었다. 그런 내가 <열 개의 우물>을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돌봄의 시간으로 꽉 채워진 그네들의 이야기에 어떤 말을 덧붙일 수 있을까.
"애를 맡길 데가 없는 거야."
40년이 지났지만 눈물부터 터져 나오는 여성들  ▲ 민들레 어린이집 자모들과 만남
▲ 민들레 어린이집 자모들과 만남 민들레 공부방에서, <열 개의 우물>의 한 장면ⓒ 감 픽쳐스
40년이나 지났건만, 그때를 떠올리면 눈물부터 터져 나오는 여성을 본다. 생존도, 양육도 너희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던 국가 아래에서 다른 여자들의 손을 빌려 아이를 키우고 노동해온 여성들이 영화에 등장한다.
내가 아는 싸우고 노동하는 여자들 중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이 있다. 큰 비전을 갖겠다며 회사는 기존 직원들을 해고시켰고, 이에 맞선 싸움이 있었다. 어느 날 회사는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부숴버렸다. '너희가 애 맡길 데가 없으면 어떻게 투쟁을 하겠냐'는 생각이었을 테다. 부서진 어린이집을 대신해 한 조합원이 자기 집을 내놓았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컸다.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가. 이 물음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렇기에 풀 하나 키우지 않으면서도 나는 돌봄에 대해 말한다. 내가 하는 일이 노동이고, 노동이 굴러가게 하는 게 세상이고, 만들어내는 게 관계이듯, 돌봄이 굴러가게 하는 게 세상이고 관계이니까.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가. 이때의 '누가'는 관계를 만들어낸다. 그 물음을 안고 40년 전, 가난한 동네에 찾아 들어간 여성들이 있었다.
"우리는 이 운동을 탁아 운동이라고 했었어요. … 육아의 문제를 사회화시켜내는 운동이다. 그런데 육아의 사회화는 보다 더 변화된 사회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변혁 운동이다. 이러면서 저희가 운동을 했죠"(최선희)
 ▲ 최선희
▲ 최선희 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사무국장, <열 개의 우물>의 한 장면ⓒ 감 픽쳐스
이 말이 좋아 곱씹다가 생각한다. '그것 또한'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아닐까.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가'의 질문은 계급을 가른다. 누가 돌볼 것인가. 국가에 묻고, 권력에 묻고, 주도권을 가진 성별에 묻는다. "성별 노동분업이 변화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마리아 미즈의 말을 떠올린다. 이들의 운동이 말해지지 않고 기억되지 않은 건 소소해서가 아니라, 너무도 세상을 뒤흔드는 이야기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도망치듯 떠난 그녀, 트럭에서 올려다 본 하늘  ▲ 자매들 수다 재밌다 모임
▲ 자매들 수다 재밌다 모임 전 해님여성회가 자수정(자매들 수다 재밌다)로 명칭이 바뀌었다. <열 개의 우물>의 한 장면ⓒ 감 픽쳐스
<열 개의 우물>에 눌러 담듯 꽉 채워진 돌봄은 가난한 동네에 공부방을 세운 이들의 이야기에만 담겨 있지 않다. 굴 따서 파는 엄마의 고생을 보며 "빨리 키가 커서 저 동일방직에 들어가는 게 내 인생 목표였어"라고 하는 마음, 상의 탈의 투쟁 끝에 경찰 버스에 끌려간 동료들이 남겨놓고 간 옷가지를 하나둘 챙기는 손. 누군가를 감싸고 어르고 챙기고 돌보는 일은 어디서나 계속 된다.
그러던 안순애가 노동운동은 더는 못하겠다고, "내 인격이 재처럼 바스러지고 있다는 느낌"에 도망치듯 트럭을 타고 사는 곳마저 떠났을 때, 그 트럭에서 올려다본 하늘이 참 고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후 그가 자신을 돌보며 긴 세월을 보내겠구나 싶었다. 풀포기 하나 없이도 돌봄에 대해 말하는 건, 나를 돌보는 일을 어렴풋이 알고,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봐야 한다.
"내가 그때 이야기 못할 것도 없어요."(안순애)
"저는 그때 이후에 삶이 더 궁금해요."(김미례)
"이후의 삶?"(안순애)
안순애와 감독과의 대화를 들으며 그 세월을 쫓아 들어간다. 여자 이장도 나오고, 꽹과리도 나오는 그 시간들 사이에서, 나는 어쩐지 감독과 안순애가 아직 만나기 전인 그 통화에서 했던 말에 머문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더라고요."(안순애)
그때 그 시절 공부방 자모회에서 어렴풋이 만났다는 꿈. 나도 그들 덕분에 조금은 꿈을 가져본다.
"꿈을 가지셨어요?"(김미례)
"네. 조금 가져봤어요."(박순분)
그때 그 시절보다 돌봄이 흔히 말해지지만, 그만큼 돌봄이라는 말이 평이해지는 요즘, 무해하지 않은 운동을 하였고, 송곳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름진 얼굴로 잘 웃는 저 여자들을 보며 사는 일의 단서를 얻었다고나 할까.
그러니 마음을 붙들어 본다. '누가'를 묻고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지. 눈을 감고 꽹과리를 치면서도 그 꽹과리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지. 도망치듯 떠나는 트럭에서도 하늘을 올려다 봐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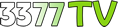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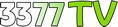
 ▲ 민들레 어린이집 자모들과 만남 민들레 공부방에서, <열 개의 우물>의 한 장면ⓒ 감 픽쳐스
▲ 민들레 어린이집 자모들과 만남 민들레 공부방에서, <열 개의 우물>의 한 장면ⓒ 감 픽쳐스 ▲ 최선희 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사무국장, <열 개의 우물>의 한 장면ⓒ 감 픽쳐스
▲ 최선희 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사무국장, <열 개의 우물>의 한 장면ⓒ 감 픽쳐스 ▲ 자매들 수다 재밌다 모임 전 해님여성회가 자수정(자매들 수다 재밌다)로 명칭이 바뀌었다. <열 개의 우물>의 한 장면ⓒ 감 픽쳐스
▲ 자매들 수다 재밌다 모임 전 해님여성회가 자수정(자매들 수다 재밌다)로 명칭이 바뀌었다. <열 개의 우물>의 한 장면ⓒ 감 픽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