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 배우가 SNS 프런트에 올려놓은 사진. 지난 2011년 이 사진을 촬영한 잡지(allurekorea) 편집진은 이렇게 적었다. ‘배우를 떠난 후 문희의 삶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과정은 결국 얼굴에 새겨진다.’ ■ 영평상 공로영화인상 받는 60년대 트로이카 배우 문희
문희 배우가 SNS 프런트에 올려놓은 사진. 지난 2011년 이 사진을 촬영한 잡지(allurekorea) 편집진은 이렇게 적었다. ‘배우를 떠난 후 문희의 삶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과정은 결국 얼굴에 새겨진다.’ ■ 영평상 공로영화인상 받는 60년대 트로이카 배우 문희
“6년간 활동 200여편 찍어
밤샘 촬영하며 차에서 쪽잠
요즘 K-무비속 후배들 보면
과장 없이 일상처럼 연기해”그는 인터뷰를 수차례 사양했다. 마음이 복잡해지는 게 싫어서 그동안 언론에 나서지 않았다고 했다. 간곡한 요청으로 막상 대화를 나누게 되자 그는 질문에 성의를 다해 답을 했다. 단정하면서도 겸허함이 느껴지는 말투였다.
문희(본명 이순임) 배우. 은퇴 후의 삶이 베일에 가려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그가 한국영화평론가협회가 주는 영평상 공로영화인상을 20일 수상한다.
“주최 측에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원로 평론가인) 김종원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설득하시는 바람에….”
그는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으나, 1960∼70년대 한국 영화 부흥기를 이끈 여배우였다. 윤정희, 남정임과 함께 트로이카로 불렸다. 단아하면서도 귀티 나는 외모로 큰 인기를 누렸다. 선배인 엄앵란 배우는 “남성들이 문희를 한 번만 보면 반해서 어쩔 줄 몰라했다”고 되돌아봤다. 이순재 배우는 “함께한 배우 중 제일 예쁘다”고 했다.
1947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19세 때 이만희 감독의 영화 ‘흑맥’으로 스크린에 데뷔했다. 이후 ‘미워도 다시 한 번’ ‘춘향전’ ‘벽 속의 여자’ ‘꼬마 신랑’ 등의 주연을 맡아 흥행시켰다. 1968년엔 ‘카인의 후예’로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차지했다.
“제가 영화계에서 6년을 활동했는데, 200여 편을 찍었어요.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일했습니다. 밤을 새워 촬영을 마치면 다른 영화 제작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서 잠을 자는 게 예사였어요. 지금처럼 배우들의 의상을 챙겨주거나 화장을 해 주는 이들이 있으면 좀 편했을 텐데, 그때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니 힘들었지요.”
그는 당시 언론에서 라이벌로 꼽았던 윤정희, 남정임 배우도 열악한 촬영 여건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고 되돌아봤다. 같은 시대에 활동한 그들에게 동료애를 느낀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 없으니… 보고 싶고… 그립고… 그렇지요.”
그는 자신의 작품 중 오늘날의 관객이 봤으면 하는 작품이 많지 않다고 솔직히 토로했다. 짧은 시간에 워낙 다작을 했기 때문에 오래 남을 만한 작품이 드물다는 것이다. “청순가련 형의 역할을 비슷비슷하게 했어요. 지금에 보면,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지요.”
 문희(왼쪽) 배우의 데뷔작 ‘흑맥’의 한 장면.
문희(왼쪽) 배우의 데뷔작 ‘흑맥’의 한 장면. 그래도 기억에 남는 작품을 꼽아달라고 하자 그는 약간 망설이면서도 답을 했다. “몇 작품 되지 않아요. 첫 작품 ‘흑맥’과 ‘초우(정진우 감독)’ ‘미워도 다시 한 번(정소영 감독)’ 그리고 ‘막차로 온 손님들(유현목 감독)’….”
그는 21세기 들어 한국 영화가 K-무비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 진심으로 기쁘다고 했다. “우리 영화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을까, 참 신기합니다. 나도 늦게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싶어요(웃음).”
알려진 것처럼 그는 1971년 장강재 한국일보 부사장과 결혼하며 영화계에서 은퇴했다. 이후 대중의 눈에 띄는 일이 거의 없었으나, 영화계 동료들의 장례, 추도식에서 간간이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꼭 가게 되더라고요. 영화계 생활은 짧았지만, 그 이후에도 선후배들과 가끔 만나곤 했습니다.”
그는 요즘 대중의 사랑을 받는 후배 배우들의 연기가 빼어나다고 칭찬했다. “우리 때는 연기가 정말 연기였어요. 과장됐지요. 요즘엔 일상을 그대로 옮겨온 듯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특히 김희애 씨 연기를 보면, 정말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병헌 배우도 뛰어나지요. 예의도 바르더군요.”
그는 최근 종영한 드라마 ‘정년이’를 잘 봤다며, 주연을 맡은 김태리 배우에게 감탄했다고 전했다. “드라마를 위해 3년 동안 국악 공부를 했다던데, 어쩌면 그렇게 소리를 잘할까요. 아시다시피, 저도 정가(正歌) 공부를 했는데, 그게 참 어렵거든요.”
정가는 조선시대 사대부 계층에서 불렀던 성악곡으로 가곡·가사·시조를 말한다. 그는 십수 년 전 정가 소리가 좋아서 취미로 배웠다가 지금까지 정진해왔다고 밝혔다.
“정가를 하며 호흡을 다스리는 것이 건강에 좋아요. 아직까진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서 특별히 신경 쓰는 건 없고, 가끔 걷고 요가를 하며….”
그는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지만, 시아버지인 장기영 한국일보 창업주(전 경제부총리)의 호를 딴 백상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버님이 나라를 위해, 언론을 위해 애쓰신 훌륭한 분이셨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지난 1993년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해 말을 아끼고 싶다고 했다. 남편이 생전 힘써 일궜던 언론사업 등에 대해 말이 잘못 전달되는 것을 경계해서다. 그는 “마음이 아프다”라는 한 마디에 가슴 속 온갖 말을 눌러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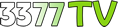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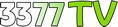
 문희 배우가 SNS 프런트에 올려놓은 사진. 지난 2011년 이 사진을 촬영한 잡지(allurekorea) 편집진은 이렇게 적었다. ‘배우를 떠난 후 문희의 삶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과정은 결국 얼굴에 새겨진다.’
문희 배우가 SNS 프런트에 올려놓은 사진. 지난 2011년 이 사진을 촬영한 잡지(allurekorea) 편집진은 이렇게 적었다. ‘배우를 떠난 후 문희의 삶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과정은 결국 얼굴에 새겨진다.’  문희(왼쪽) 배우의 데뷔작 ‘흑맥’의 한 장면.
문희(왼쪽) 배우의 데뷔작 ‘흑맥’의 한 장면. ![스낵무비·재개봉작·콘서트 실황…100만 어려운 극장가 자구책 [N초점]封面图](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4/11/09/0007896556_001_20241109070039448.jpg)




